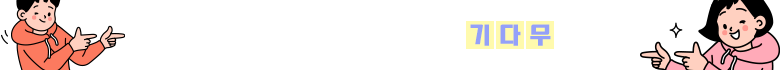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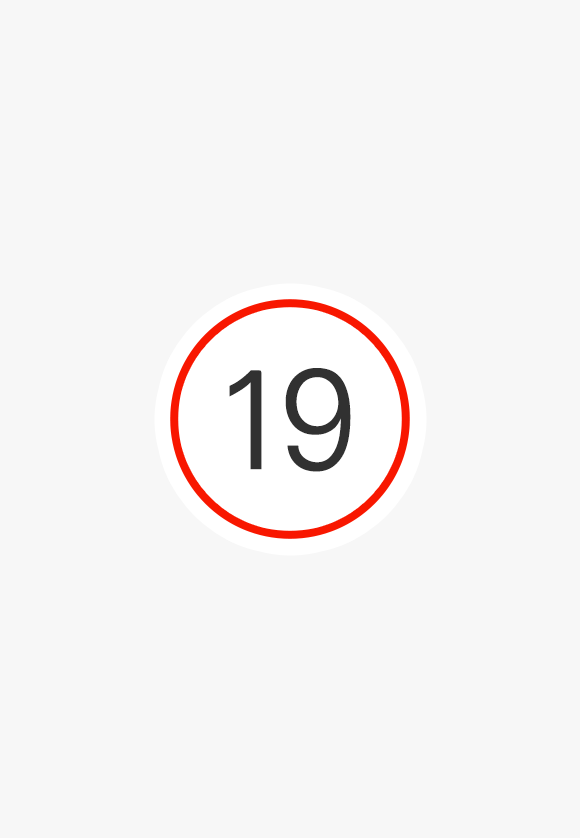
로맨스후작가의 꽃은 월요일에 피어난다
 0
0
타네시아는 일찍이 희망이라는 것을 버리고 자랐다. 아비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그저 각종 병을 달고 사는 어미를 대신해 뒷골목에서 동냥질이나 하며 입에 풀칠을 했다. 어쩌면 사랑을 갈구했던 것도 같다. 아주 가끔 돈을 많이 벌어오는 날에는 안아주기도 했으니까. 그것이 그녀의 삶을 지탱하던 희망이라면 희망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미는 타네시아를 로즈윌 자작가에 팔아넘겼다. 성인이 된 후 자작은 기다렸다는 듯 타네시아를 범했다. 싫든 좋든 그녀는 성 노리개가 되어야 했다. 희망은 절망과 닮아있었다. 기대는 실망을 동반하였으며 삶은 비극과 연결됐다. 기대를 버린 지 오래였다. 포기하고 순응하면 아침은 밝고 제 역할은 끝날 테니까. 그런데 언제나 칠흑 같던 레스턴 자작의 침실에 빛이 들었다. 인위적으로 밤을 부수고 들이닥친 남자. 무슨 일일까. 그의 검에서 섬광이 내리치고… 레스턴 자작의 머리통이 땅으로 떨어졌다. 테오도르 프레데릭…. 그녀를 옥죄고 있던 족쇄를 풀어준 남자의 이름이었다. 언제나 새까만 밤이던 이 지옥 같은 방안에 한 줄기 빛과 함께 검은 태양이 굴러 들어왔다.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귀한 신분의 남자와 함께 있다고 그녀가 귀해지는 건 아니었다. 천한 피가 흐르고 천하게 굴러먹은 세월이 씻기는 게 아니었다. “…그런 거? 넌 네 자신을 그렇게 낮춰 부르나?” “객관적인 거죠.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단어들을 모두 합친 사람이 저예요. 뭐가 됐든 좋은 이름으로는 불려본 적이 없죠.” 타네시아가 배운 거라고는 하나뿐이다. 남자를 즐겁게 해주는 것. 그러니 이 후작이라고 다를 건 없었다. 이 남자도 사람이고 사내이니까. 그저 밤손님이 바뀌는 것뿐이다. “비웃음, 그깟 건 안 들리는 척 조금만 견디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좋은 옷과 푹신한 침대, 제 배를 채워줄 귀한 음식이 따라오거든요. 전… 그저 무게를 쟀을 뿐이에요.” 누군지도 모를 이들의 손가락질과 보상으로 따라오는 안락함, 그 둘의 무게를. “그래서 너는 너를 버렸구나.” 오만하고 고귀한 후작, 그가 제 자신을 버린 타네시아를 구원하려고 한다. 그녀는 남자의 손을 잡아도 되는 걸까? 다시 한번 기대라는 것을 품어도 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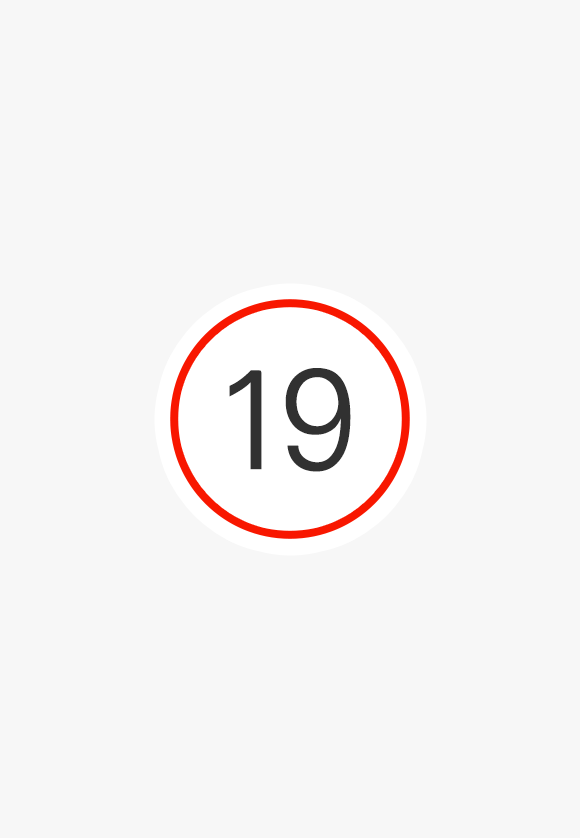
- 한권소장 : 32코인
- 전권소장 : 코인
코인 지불 후 특정 기간동안 작품을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한권 대여 시 3일, 전권대여 시 30일)
코인 지불 후 기간에 상관없이 큐툰 서비스 종료 전까지 언제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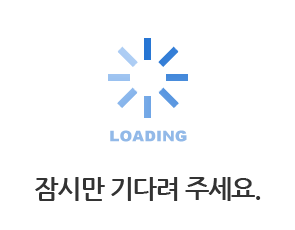


 한국저작권보호원 인증
한국저작권보호원 인증
 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 인증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웹툰 | 로맨스

웹툰 | BL

웹툰 | 판타지

웹툰 | BL

웹툰 | 로맨스

웹툰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웹툰 | 로맨스

웹툰 | 로맨스

웹툰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판타지

웹툰 | 로맨스

웹툰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웹툰 | BL

웹툰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소설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소설 | BL

소설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로맨스

웹툰 | 로맨스

웹툰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웹툰 | 로맨스

웹툰 | 로맨스

웹툰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웹툰 | 로맨스

웹툰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웹툰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웹툰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웹툰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웹툰 | 로맨스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만화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만화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만화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